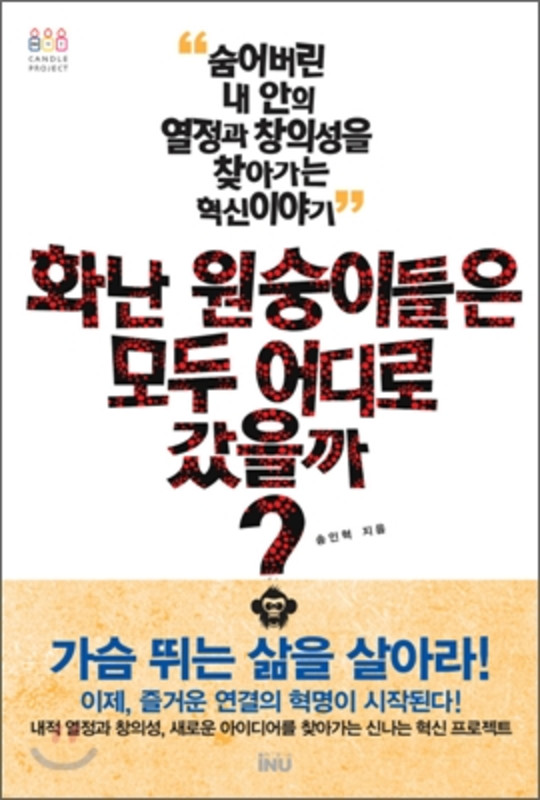
‘화난 원숭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?’라는 제목에서 호기심을 느껴서 읽게 된 책인데,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것 같다. 개인적으로 장황하게 말로만 떠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구성을 선호하는데 딱 그런 스타일의 책이다.
저자는 조직에 존재하는 만성적인 무력감, 포기, 체념의 개념을 체득한 사람들을 화난 원숭이라고 표현하고,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모원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. 얼핏 보기엔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, 화난 원숭이를 소개하는 섹션과 이모원숭이를 소개하는 섹션을 보고는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.
조직 생활을 해본,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끼지만, 조직의 벽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, ‘아마 안될 거야.’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자신과 조직의 모습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. 그리고 조직원 구성원 사이에서도 이타적인 생각보다는 나만의 일, 나를 돋보일 수 있는 일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. 하지만, SNS나 TED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, 사람들은 조직 외에서는 참 이타적인 것 같다. 나 자신도 회사 일의 경우,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게 나의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지만, 외부의 일에 대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려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.
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패널 활동이 있는데,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, 정말 비효율적이고, 쓸데없는 일-물론 내 기준에서만 본다면-인 것 같지만, 이득보다는 뭔가 좀 더 제대로 된 제품을 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, 조직의 울타리를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사람들은 이타적이 되는 것 같다.
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내부에서 보면 문제점은 많이 보이지만, 해결해야 될 부담스러운 문제점으로 보이지만, 외부에서 보게 된다면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,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다.
저자는 이런 이타적이고, 창의적인 일련의 활동들을 어떻게 퍼실리테이션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, 이런 퍼실리테이션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면서, 모든 창의성, 가능성은 개인에게 있으며, 개인들을 연결하고 있는 ‘사이’에 존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.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. 반드시 창의성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에게만, 애플 같은 기업에만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.